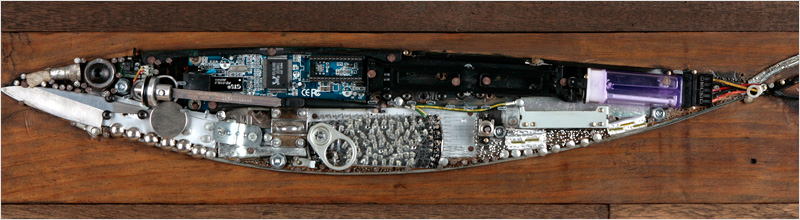(8) 격동기의 보헤미안 양수아
|
(8) 격동기의 보헤미안 양수아 |
|
天刑처럼 둘러씌운 사상의 그물망에서 영혼의 부활 꿈꿨다 |
1953년, 결혼하던 그 해, 양수아는 목포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했다. 동료교사로는 훗날 희곡으로 명성을 날린 차범석이 있었고, 미술부 제자로는 김지하(시인)와 이석우(경희대 교수) 등이 있었다. 부임하던 해 차범석이 각색 연출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의 미술무대를 맡기도 했다. 그때부터 양수아 양화연구소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지도했다. 당시의 상황을 제자인 이석우는 이렇게 회고한다.
"중학교에 입학해 어느날 수업시간에 그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집에 오면 지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그림에 막연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나는 우리집 마당의 장독대를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인 양수아의 집을 찾았다. 그날 비교적 다수의 문하생들이 그곳에 모여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다기 보다는 거기에 흠뻑 취해들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정물을 그리고 서로가 번갈아가면서 모델을 서주었으며 조잡한 물감이었지만 탓하지 않고 좋은 효과를 내려고 애썼다. 석고데생도 하고 크로키도 하고 주말이면 예외없이 야외스케치를 나가면서 수채화와 유화의 정통코스를 밟고 있었다.
목탄이 없어 우리는 숯을 구워 사용했으며 캔버스를 구하기 힘들어 베니아판 위에 그림을 그려야 했다. 선생님은 엄해보였지만 훈훈한 분위기를 풍겨주고 여간 잘못하지 않는 한 화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술을 드시는 것을 보면서도 참으로 술을 멋있게 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 맛을 같이 즐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린 그림을 주말쯤이면 모두들 앞에서 선생님이 총평해주셨는데 구도, 선, 표현기법이나 양식 등을 소상하게 이야기 해주셨고 루오, 고흐, 고갱, 피카소, 브라크, 로트렉, 세잔, 마티스 등을 자주 말씀하셨다. 그는 특히 고흐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티스의 포비즘이나 표현주의 같은 현대미술운동에 대해서도 가끔 언급한 것으로 기억된다."
늘 자상했으나 제자들의 그림에 대한 평은 매우 진지했다. 그는 늘 '가난에 굴복하지 말도록', '파레트에 물감이 마르지 않도록' 독려했다. 입버릇처럼 "종이에 그림 그린다고 다 그림이 아니다. 절대 눈요기감으로 그리지 말아라. 그림은 정신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라며 '내면의 드러냄'을 제자들의 가슴에 교훈처럼 새겨주곤 했다.
호쾌한 미술이론, 특히 작가의 실험 정신을 중시하던 양수아의 강의는 열성적이었다. 특히 실기지도 때는 언제나 잘된 곳을 먼저 지적해 주곤 했다. 그의 강의는 매우 신선하고 언제나 따뜻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내부에서는 당시의 암울하고 혹독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의 도피행이었다.
그 시절의 어느 무렵, 갑자기 양수아가 떠들썩해져 버렸다. 절망에서 격발된, 환상으로의 도피가 갑작스럽게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조용하고 단정하던 그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거의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입에 쏟아붓듯 무작정 마셔대기 시작했다. 과장된 몸짓이 시작되고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제꼈다. 매일 목포 오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유쾌하게 웃어댔고 쉬임없이 떠들어댔다. 새로운 양수아가 튀어나오면서 마침내 현실에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신접살림을 꾸려나가던 당시 곽옥남은 남편의 월급봉투를 기대할 수 없었다. 사상문제로 낙인찍힌 양수아에게는 늘 형사가 따라붙으며 감시망을 펴고 있었다. 그러다가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물망을 조이며 뒤흔들어대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형사에게 월급봉투를 던져버리고는 어김없이 외상술집을 찾아들 수밖에 없었다. 술을 마시며 그때마다 양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에게 덧씌어진 그물망의 현실을 절감하며 어떤 피안을 꿈꾸었을까.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곽옥남은 수예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예솜씨는 길쌈으로 가계를 꾸려왔던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수예품은 주로 베개수, 옥양목, 방석 등이었다. 화가를 꿈꾸며 미술수업에 열중했던 그녀가 직접 도안해 제작한 것들이었다. 그녀의 수예품은 당시로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었고, 매우 아름다워 인기가 좋았다. 양수아의 빨치산 입산으로 인해 가산이 거덜나버린 집안에 이는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양수아 부부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시누이와 시아주버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사상문제가 굴레가 돼 가난이 현실이 돼버린 집안에 곽옥남의 수예작업은 생계로 이어지는 한줄기 가느다란 끈이었다.
양수아는 몹시 절망했고, 날마다 심한 우울증이 정신의 벌판에 짙게 드리워졌다. 숨이 막혔고, 가난이 너무 버거웠다. 마침내 우울의 동굴에서 그는 도피를 꿈꾸었고, 어느날 죽을 힘을 다해 정신에 잠궈진 우울의 문을 열어젖혀 버렸다. 과장된 몸짓이 시작되며 그의 정신이 붕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우울증에서 조증(躁症)으로 인식이 튀어오르면서 심각한 조울증이 시작된 것이다. 양수아는 이때부터 우울증과 조울증 사이의 긴 지평을 밤과 낮처럼 왕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우울한 구상작업보다는 황홀한 비구상작업에 더욱 오래 머물고 싶어했고, 이곳에서 침식돼버린 영혼의 부활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다. / 시인ㆍ문예비평가
■ 그때 그 순간
시인 김지하의 회고
양선생님 집서 봤던 누드화 결국 미술의 길로 들어서고…
중학 1학년 무렵.
예술이라기보다 예술의 예감, 예술의 조짐 같은 것이 있었다.
유년기에 그림에의 한(恨)같은 것이 있었는데 중학에 가면서 모르는 새 억압이 되었다. 그래 별로 심하게 그림에 기울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끔 그리기는 그렸다. 우선 미술선생이셨던 양수아 선생님이 생각나고 미술반장이었던 김용기 형이 생각난다.
농구화 한 켤레를 수채로 그린 것이 목포지구 중학생 전시회에 입선되었는데 그 무렵 죽동 유달산 밑에 있는 양선생님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김용기 형을 만났다. 양선생님은 이름처럼 우아하고 청결하게 생긴, 그야말로 예술가였고 김용기 형은 우락부락한 체육기질인데도 정이 많고 재주 많은 재담가였다.
자그마한 일본식 목조가옥의 안방이었다. 거기서 양선생의 젊은 부인과 그 부인의 누드화를 함께 보았다. 나는 그 때문에 내내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했던 것이 기억난다.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창으로 비껴 들어와 커다란 누드 화면에 비쳤는데 누드는 곧 살아나 춤을 출 듯 생생해지는 것이었다. 크게 당황하면서도 예술이란 이런 것인가 내심 크게 놀라고 있었다. 김용기 형이 눈치채고 떠들어댔다.
"왔다! 참말로, 예술이란 것은 무서워라우 잉! 무서워 잉!"
양선생님이 눈치채고 빙긋이 웃으셨다.
"영일이는 앞으로 그림 할라냐?"
"아니요."
"그래? 소질은 있는데 잉∼!"
"…"
훗날 내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미학과에 입학한 뒤 회화과에 있는 한 친구와 함께 이화동 입구의 한 음식점에서 양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영일이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데 잉-!"
김용기 형은 미학과 선배였다. 용기형은 배고플 때 밥도 사주고 출출할 때 술도 사줬으나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내가 절망할 때 그 부리부리한 눈에 불을 달고 그 능란한 언변으로 내게 희망을 퍼부어 주었던 것이다. 용기형도 또 그 말을 했다. 침침한 어느 닭도리탕 집에서였다.
"영일이는 그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잉-!"
미술.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내겐 한인가? 결국 그림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가? 비록 문인화지만 요즘 난초에 열중하여 하루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난치는 일을 못하면 무엇을 크게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인가? 알 수 없다. 예술이란 것이 삶과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더 알 수가 없다.